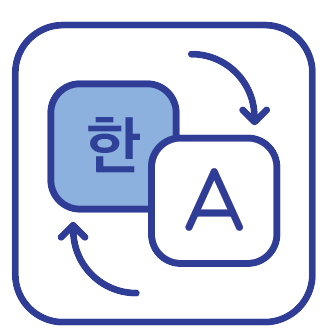산업뉴스
| 제목 | “고무신부터 나이키까지… 흙길 오르내리며 많이도 만들었지” [산복빨래방] EP 8 | ||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563 |
“고무신부터 나이키까지… 흙길 오르내리며 많이도 만들었지” [산복빨래방] EP 8
2022-07-21 563


산복빨래방을 찾아와 빨래방 식구들과 웃고 떠드는 어머님은 당시 한국 신발산업을 이끌던 ‘여공’이었다.
사진은 현덕순 어머님이 30년 넘게 부업으로 하고 있는 신발 밑창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안녕하세요, 산복빨래방입니다.
무려 반세기 전, 산복도로에는 고무공장에 출근하는 ‘신발쟁이’들로 밤낮 없이 북적였습니다.
빨래방을 찾는 70대 어머님들 중에는 당대 최고의 여공이 여럿입니다.
삼화고무 공장에 다녔던 현덕순(73) 어머님도 그중 한 명입니다.
국제·태화·삼화 등 부산 밀집
산복도로 주민 중 재직자 많아
열 식구 부양한 현덕순 어머님
생계 위해 고무공장 문 두드려
점심시간까지 일 배우는 열정
조장 눈에 띄어 ‘창쟁이’ 활약
나이키·리복 등 브랜드도 제작
여공들의 헌신으로 부산은 당시 전국 신발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부산진문화원 제공
■나이키의 추억
처음에는 바이어(buyer)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바다 건너 귀한 분이 온다고만 들었다.
바로 옆에서 신발창(신발의 바닥이나 안에 대는 고무나 가죽)을 붙이던 언니가 “오늘 공쳤네”라면서 투덜거릴 때도 고개를 갸웃했다.
50년 전, 당시 23세였던 덕순 씨의 궁금증은 금새 풀렸다.
한창 신발이 내려와야 할 컨베이어 벨트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키가 멀대 같이 크고 피부가 허연 외국인이 작업장 안에 들어왔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조장도 그날만큼은 외국인 옆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저것 설명했다.
바이어는 벨트 위 신발을 유심히 보더니 이따금씩 빨간 스티커를 붙였다.
실밥이 조금 튀어나오거나 때가 좀 탔다는 이유만으로 ‘불량’ 딱지를 받은 신발이 늘어갔다.
조장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할 때 쯤 바이어는 영어로 큰 소리를 치더니 떠나버렸다.
뒤이어 조장이 여공들을 집합시켰다.
“립만 바를 줄 알았지, 창 하나 제대로 못 붙이느냐”며 한참 동안 욕을 쏟아냈다.
눈 둘 데가 없어 괜히 죄 없는 신발 옆 나이키 로고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고무공장 그만 둔 뒤로 아직도 ‘나이키’를 안 신는다카이. 그때 시달린 기억이 너무 남아가지고. 나 포함해서 30명이서 하루에 신발 800족을 만들어야 했어. 근데 바이어 온다고 컨베이어 벨트 천천히 돌렸제, 불량 딱지 받은 신발은 전부 뜯어내서 다시 만들어야 하제. 평소 800족 만들 시간에 600족 밖에 못 만드는기라. 그러면 그날은 저녁 8시든 9시든 할당량 다 채우기 전까지는 퇴근 몬하는 기라. 나중 되니까 여공들끼리 ‘그놈의 바이어 좀 오지 마라 캐라’ 했다니까.”
■열 식구 먹여 살린 고무공장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덕순 씨는 20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남편을 따라 진주로 갔지만 워낙 먹고 살 게 없어 막막했다.
그러던 차, 부산에 사는 큰집 식구들이 부산에 오는 게 어떻냐고 권유했다.
그렇게 덕순 씨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 시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편에 몸을 실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부산은 큰 도시니 뭐라도 할 게 있겠지’라고 불안함을 애써 달랬다.
세를 낼 돈도 마땅찮아 범천동 ‘산만디’에 터를 잡았다.
지금에야 ‘산복도로’하면 사람들이 알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흙길이었다.
그렇게 세 명이서 단칸방에 살기 시작했다.
희한하게 식구는 늘어갔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함께 살게 됐다.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인 남편이 둘째 시숙의 딸 둘을 데리고 왔다.
한 지붕 아래 10명 가까운 식구가 복닥복닥 모였다.
덕순 씨가 ‘이거 큰일났다.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고 하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고민 끝에 문을 두드린 곳은 바로 ‘고무공장’이었다.
당시 부산에는 국제상사·태화고무·삼화고무·동양산업·진양화학 등 규모가 큰 고무공장이 모여있었다.
나이키·리복 같은 해외 브랜드 신발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수출됐다.
‘고무공장이 나라에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들 했다.
덕순 씨는 가장 가까운 삼화고무를 찾았다.
옛 삼화고무 공장(현재 범천경남아파트 자리)은 집에서 뛰면 5분 만에 갈 수 있을 거리였다.
■‘시다‘부터 ‘창쟁이’까지
덕순 씨는 ‘창쟁이’로 통했다.
공장 안에는 여러 쟁이가 있었다.
뺀칠(본드칠)을 하는 사람은 뺀쟁이, 대프질(테이프 붙이기)을 하면 대프쟁이라고 불렸다.
덕순 씨는 신발창을 붙인다고 해서 창쟁이였다.
이렇게 ‘쟁이’ 이름이 붙은 사람들은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5~6만 원 월급을 더 받았다.
일반 근로자는 월급이 15만 원 정도였지만 쟁이들은 20만 원을 넘었다.
처음부터 덕순 씨가 창쟁이였던 건 아니다.
갓 공장에 입사했을 때는 ‘시다’(업무 보조를 뜻하는 속어)라며 신발 끈을 묶거나 신발창을 압축시키는 단순한 업무만했다.
뺀칠(본드칠)과 신발창 붙이기, 대프질(테이프 붙이기) 등 전문적인 기술은 도통 가르쳐 주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덕순 씨는 점심시간만 되면 남들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창 붙이는 기계 앞에서 몰래 연습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니, 눈치 보며 스스로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덕순 씨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본 걸까. 한날은 점심시간에 조장이 슥 오더니 “뭐합니꺼” 물었다.
덕순 씨는 짐짓 모른 체하며 “창 붙이는 거 연습하고 있지요”하며 창을 붙이기 시작했다.
천만다행으로 신발에 창이 잘 붙었다.
그때부터 덕순 씨는 ‘창쟁이’가 됐다.
■업 그리고 정
매달 10일은 덕순 씨에게 가장 기다려진 날이다.
남편과 월급을 보태서 쌀 한 가마(약 80kg), 보리쌀 10되(약 16kg), 연탄 100장을 사고 집에 들어갈 때면 그야말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월급날 공장 입구는 시골 오일장 저리 가라였지. 교통부(현재 범곡사거리)에는 과일, 찌짐, 떡볶이 파는 장사꾼부터 술값 외상 돌려받으려고 진을 친 식당 주인들로 북적북적했어. 주말에는 쇼 보러 보림극장에 온 젊은이들도 많았지. 당시엔 거기서 버스 타면 해운대건 서면이건 어디든 갈 수 있어서 교통 편하다고 교통부라고 불렀거든. 우리 시엄니가 좋아하시는 막걸리까지 사가지고 가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덕순 씨는 아직도 산복도로 골목마다 사람으로 북적이던 그 시절이 생생하다.
워낙 고무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비교적 공장과 가까운 산복도로에는 남아나는 방이 없었다.
집주인들은 ‘애 있으면 시끄럽다’ ‘가족 몇 명 이상이면 안 받는다’는 식의 배짱 장사를 할 정도였다.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침마다 통근버스는 콩나물시루나 다름 없었다.
덕순 씨는 일을 시작한 지 약 5년 뒤 살림을 도맡게 되면서 고무공장을 그만뒀다.
살림을 맡아 주던 시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고무공장이 외국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더니, 진짜로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사라진 고무공장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고즈넉한 산복도로 골목을 바라볼 때면 예전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던 때가 신기루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덕순 씨는 여전히 산복도로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또 너무 깊은 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공장 다닐 때는 10명 가까운 식구 먹여살리며 ‘내 업이다‘하며 버텼지. 근데 공장 나온 뒤에도 어찌 하다 보니 마을에서 같이 밤도 까고, 쓰레빠(슬리퍼) 깔창 붙이고 살면서 정이 붙어버렸어. 지금은 살만해졌는데도 여기가 좋아. 아마 앞으로도 여기서 쭉 살지 싶어.”
오늘날 부산과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신발 기업들의 성공 신화. 그 속에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업’이라 생각하고 버텨낸 여공들의 위대한 삶이 스며있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들의 피땀은 사라지지 않고, 환한 미소가 되어 산복도로 어귀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2022-07-19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