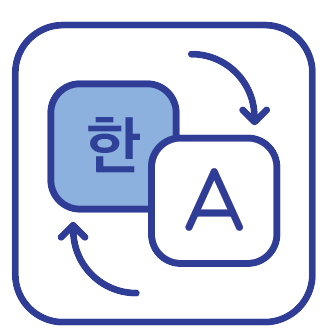산업뉴스
| 제목 | 미싱부터 고깃집 서빙까지, 산복도로의 다른 이름 '엄마' [산복빨래방] EP 9. | ||
| 작성일 | 2022-07-28 | 조회수 | 511 |
미싱부터 고깃집 서빙까지, 산복도로의 다른 이름 '엄마' [산복빨래방] EP 9.
2022-07-28 511




안녕하세요 산복빨래방입니다.
산복도로에는 많은 엄마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 신발의 전성기를 이끌던 여공 ‘엄마’, 자식을 키우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는 ‘엄마’, 배타는 남편을 기다리며 가족을 지키던 ‘엄마’. 빨래방에 빨랫감을 맡기러, 찾으러 와서 아무렇지 않게 터놓는 어머님들의 옛 이야기에 그 시절 힘들고 고됐던 우리 엄마들의 삶이 녹아있습니다.
오늘은 빨래방 단골 장순엽(70) 어머님의 이야기로 ‘엄마’를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순엽 씨는 매일 새벽 밥과 반찬 3개, 국을 꾹꾹 눌러 담아 아이들이 먹을 도시락 3개를 만들었다.
3시간도 채 못 잔 탓에 온몸이 누가 때리고 간 듯 쑤셔왔다.
하지만 매번 도시락 반찬은 달랐다.
도시락 3개를 식탁에 줄지어 놓은 뒤 순엽 씨는 긴 머리칼을 휘날리며 문밖을 나왔다.
행여나 늦을까 집을 나오자마자 높은 계단을 뛰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에 무사히 오르자 온몸의 긴장감이 풀렸다.
눈이 스르르 감겼다.
자리가 있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마을 급커브 길을 버스가 이리 꺾고 저리 꺾자 몸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산골마을에서 중앙동 시내까지는 20분 남짓. 기사는 곡예 운전을 하듯 핸들을 꺾었다.
잠에 빠진 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애써 몸을 일으켜 다시 의자에 앉으려 하면 어느새 내려야 했다.
몸이 바닥에 엎어져도 그 시간이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다.
새벽에 출근해 밤 11시가 넘어 겨우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다 자고 있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가져온 도시락 통을 씻고 새로운 찬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12년, 두 아들은 알아서 잘 컸다.
순엽 씨 나이 22살. 전남 광양에서 결혼한 순엽 씨는 부산 고무공장에 취직했던 남편을 따라 부산에 왔다.
■독학 미싱공
순엽 씨의 첫 직장은 고무공장이었다.
28살. 올해 마흔 여섯이 된 아들이 6살 때 이 동네 사람 누구나 다니는 고무 공장에 첫 발을 디뎠다.
전남 광양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부산에 와서 처음 취직한 곳이었다.
당대 최고 기업인 삼화고무의 넘쳐 나는 물량을 소화하는 외주 기업이었다.
처음 고무 공장에 가니 운동화 실밥을 트는 일을 주었다.
점심 시간 종이 울리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냅다 달렸다.
6살 작은 아이 밥을 먹이고 다시 가서 일을 했다.
그렇게 두 달을 일해서 받은 돈은 한 달에 10만 원 남짓이었다.
옆 미싱 부서 여공들은 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월급은 배로 받았다.
“엄마가 점심 때 며칠 못 온다.
혼자 먹고 놀고 있어.” 6살 아들에게 이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을 시작한 이상 많이 벌어야만 했다.
점심 시간이 되기 만을 기다렸다.
점심 시간이 되자 미싱부 젊은 여공들이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갔다.
두어 달 옆에서 본 바로 미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다.
조용히 가서 미싱을 잡았다.
“드르르르” 생각보다 할만했다.
그렇게 일주일을 몰래 미싱을 잡았다.
미싱조 여공들은 그녀를 경계하고 나무랐다.
“나 없을 때 막 하면 안돼요 아줌마, 고장나요 고장나.” 일주일 해보니 감이 왔다.
미싱조 조장을 찾아갔다.
"나 월급 좀 올려주소."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은 미싱을 하겠다는 말이었다.
“미싱 언제 해본 적 있어요?” 조장이 물었다.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미싱 앞에 앉았다.
조장은 화들짝 놀랐다.
"언제 배웠어요 아줌마?" 그렇게 실밥조에서 미싱조로 승진(?)을 했다.
미싱조에서는 운동화 찍찍이 붙이는 걸 맡았다.
기계를 다루는 것과 손으로 실밥 트는 건 차원이 달랐다.
월급이 달랐다.
1년간 고무 공장을 다녔다.
몸이 상해가는 게 느껴졌다.
독한 라텍스 접착제 냄새가 익숙할쯤 어지러움이 일상이 됐다.
요즘 흔한 마스크 한 짝이 없었다.
회사에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집 앞까지 조장이 찾아와 일을 조금만 더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미싱 일은 '고임금'이었지만 너무 고됐다.
추석 대목을 끝으로 일을 그만뒀다.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다.
"퇴직금은 받았나?"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남편의 성화에 못이겨 노동청을 찾아갔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왜 말을 안하고 노동청을 찾아가요?” 1년 치 평균 월급 수준의 퇴직금을 노란 봉투에 받았다.
퇴직금을 안 준다고 노동청에 찾아 간 사람은 순엽 씨가 유일했다.
“나이 어린 딸들 고용해서 하니까 퇴직금이 뭔지도 모르고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했어.” 그 뒤 순엽 씨 동료들은 모두 퇴직금을 받았다.
엄마가 한 말은 "숙제 잘 해가라"는 말 밖에 없었지만 두 아들은 잘 컸다.
■160만 원짜리 컴퓨터
“엄마 나 컴퓨터 갖고 싶어” 중학생 된 아들이 처음 요구한 물건이었다.
남들 다 가는 학원도 “학교에서 배우면 된다”며 가지 않는 아들이었다.
아들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
다른 학원은 싫다던 아들이 컴퓨터 학원을 다니더니 컴퓨터가 갖고 싶다고 했다.
'얼만데' 묻지도 않았다.
“어디 파는데?” 순엽 씨는 가격이 얼마든 사주고 싶었다.
그 무렵 순엽 씨는 고무공장을 그만두고 중앙동에 일자리를 구했다.
3일간 중앙동 일대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찾았다.
한 고급 갈비집에 취직했다.
당시 순엽 씨가 한 달에 벌던 돈은 20만 원이었다.
물론 장사 준비를 위해 아침에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고된 노동이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짬을 내 아들과 서면 전자상가에서 만났다.
컴퓨터는 160만 원이었다.
4개월 치 월급으로 컴퓨터를 사줬다.
남편은 “왜 저런 걸 사줘서, 하루 종일 쪼그만 거(컴퓨터)만 들다 보고 있게 하냐”고 타박했다.
산동네 호천마을에서 컴퓨터 있는 집은 순엽 씨 집이 유일했다.
아들은 그 때 사 준 컴퓨터 때문인지 기계공학과를 나와 대기업 연구원이 됐다.
둘째 아들의 졸업식 날. 집안의 두 기둥은 세월이 흘러 어느덧 각자 가정을 꾸리고 순엽 씨의 자랑거리가 됐다.
■고생 끝 행복 시작
12년 식당 서빙 생활을 하며 순엽 씨의 몸은 성한 곳이 없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팠다.
옛날엔 먹고 살기 바빴다면 요즘은 병원 다니기 바쁘다.
고깃집에서 안 좋은 자세로 연기를 계속 쐰 탓인 듯 싶기도 하다.
이제 나이 칠십이 넘어 남편과 저녁 먹고 고스톱 치는 게 소소한 일상이 됐다.
“요즘 사람은 상상도 못해. 너무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 후회와 자부심이 섞인 말이다.
2022년 칠순이 된 순엽 씨는 더 이상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만큼 요즘도 바쁘다.
병원도 가야 하고 마을 풍물패에서 장구도 치고, 뒤늦게 사귄 마을 친구들과 나들이도 간다.
돈 버느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40년 넘게 산 마을 사람들을 최근에야 만나며 조금씩 친분을 쌓고 있다.
“요즘 재밌어, 바빠 아주 바빠. 동네에서 장구도 쳐야 되고 에어로빅도 해야 되고 하루 하루가 너무 신이 나지. 그래도 그때 고생했으니까 지금 이만큼 사는 것 같아”
그 시절 그만큼 고생해서 지금 이만큼 산다고 말하는 순엽 씨, 순엽 씨는 요즘 행복하다.
순엽 씨의 이야기가 끝이 날 무렵,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남편은 조선소 다니고 나는 갈빗집 서빙하고 정신 없이 지내다 보니까 아들한테는 학교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만 해서 가라고 말했어. 옛날에는 숙제 안 해 가면 맞았거든. 맞으면 마음 아프니까. 나중에 다 크고 이야기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우리 키았나. 우리끼리 컸지.'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지금 생각하면 마음에 대못이 박히고 미안했어. 우짜든지 느그들 열심히 잘 살고 아들들은 우리집 기둥이니까. 지금처럼 잘 살자 우리 식구들”
가족을 위해 온갖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오롯이 가족에게 쏟아낸 엄마 순엽 씨의 삶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2022-07-26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