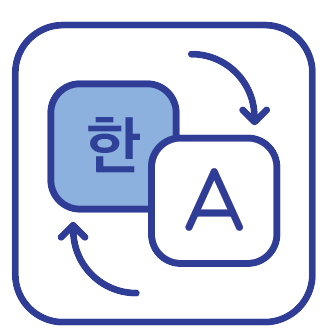신발 人
| 제목 | "장애인에게 특수 맞춤신발은 날개죠" | ||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2924 |
"장애인에게 특수 맞춤신발은 날개죠"
2020-12-04 2924
“장애인에게 특수 맞춤신발은 날개죠.”
한평생 이름 모를 짐승의 가죽을 어루만지고 두들겼을 낯선 남자의 손 거죽이 자신의 동반자인 연장을 찾아 헤맨다.
제아무리 손을 씻고 씻어도 그의 손에 밴 세월의 흔적이 또렷하다.
그의 손이 기억하는 건 지독한 가죽 냄새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장에 새구두를 신고 잔뜩 상기된 얼굴로 거울을 보는 사회 초년생, 설을 맞이해 자식에게 큰마음을 먹고 신발을 사주는 아버지와 그 신발을 안고 문을 나서는 아이. 40년이 넘는 세월, 그의 손과 그 손으로 만든 구두는 숱한 이야기와 풍경을 빚어냈다.
사연 많은 손을 가진 그는 수제화 전문점 ‘가인제화’의 김정량(63)씨다.
김정량 가인제화 대표는 중구청이 인증한 수제화 명장이다.
지난 10월 31일 중구청은 향촌동 수제화산업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에게 명장 칭호를 부여했다.
김정량 대표는 작년 1회에 이어 올해 제2회 수제화 명장으로 선정됐다.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인정받다
김 씨가 처음 구두를 배운 건 18살부터다.
철공 기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친척 어른을 따라 수제화 공장에 처음 방문했다.
당시 70년대엔 ‘칠성 수제화’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고급한 신발이었다.
마침 구두 모양을 내는 패턴사가 없어 일을 배우게 되었다.
“자립해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을 배워야했죠.”
처음엔 구두굽을 달기 위해 가죽을 접고 풀칠만 하다가 미싱하는 법을 배웠다.
남다른 열정을 알아본 친척이 서울에 가서 제대로 배워오라고 권했다.
서울은 만만치 않았다.
공장에서 기술을 가진 직인을 선생님이라 했는데 기술은 안 알려주고 견습들에게 일만 시켰다.
심지어 월급도 마음대로였다.
견습생 3개월 동안은 암묵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는데 심하면 6개월 동안 안 주는 경우도 있었다.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다.
6명의 선생님을 거치고 나니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많아졌다.
자연스레 도울 수 있는 일도 많았다.
김 씨가 맡은 미싱일이 끝나면 재단도 도와주고 굽도 달았다.
일은 대부분 미싱이었지만 김 씨는 재단이 하고 싶었다.
어떻게 가죽으로 모양을 내는지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다.
하지만 서울공장은 그에게 재단을 맡겨주지 않아 대구로 내려왔다.
재단일을 시작하면서 김 씨의 눈썰미는 더욱 빛났다.
“서울에 구두 표본이 나오면 전부 스케치하고 대구 오는 열차 안에서 이걸 어떻게 했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김 씨를 스카웃하려 했다.
나중에는 공장끼리 “저 사람 스카웃하지 말자”고 담합을 했다.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막는 신사협정이었다.
“기술을 인정받은 셈이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공장을 차려보자.”
집 부엌에 차린 수제화 공장에서 김 씨는 외국 구두 카탈로그를 카피하며 기술을 갈고 닦았다.
그렇게 따뜻한 밥 냄새만 나던 그의 작은 부엌에 가죽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연어처럼 되돌아온 수제화 바람
한때 수제화를 떠났던 때도 있었다.
구두 만들 때 필요한 가피 산업에 손을 댔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지인과 20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900만원 넘게 번 것이다.
그때 나이가 겨우 24살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큰돈을 만지니까 자만에 빠졌다”며 “돈을 가볍게 쓰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하자 다시는 구두일을 하지 않겠다며 일을 접었다.
그럼에도 김 씨는 구두를 곁에 계속 뒀다.
택시를 몰면서 손님에게 구두를 팔았다.
그게 소문이 났는지, 그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다.
영진제화에서 그를 불렀다.
지금의 가인제화다.
그는 1997년에 가인제화를 인수하면서 처음부터 공장을 일궜다.
그는 다시 근로자 의 삶을 살기로 했다.
“장사는 모르겠고 신발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자 교통인구도 적은 곳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 구미 공단 근로자들도 신발을 사러 찾아왔다.
사연을 가진 손님들도 많았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때 신발 앞창을 끄는 손님도 있었다.
신발의 균형을 다시 맞춰줬다.
그때 맞춤 신발을 제작해 준 손님은 지금도 그에게 신발을 수리받는다.
“어제도 와서는 ‘사장님 내가 오면 불편하시죠. 그래도 수리비는 바로 쏴주잖아요’ 래요. 엄청 밝은 손님이에요. 그만하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싫다네요. 휠체어 타면 다리가 자기 게 아닌 게 된다면서요. 손님도 자기 발로 걷는 걸 엄청 행복해해요.”
특수신발은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낀다.
발목이 기울어졌거나 모양이 한쪽으로 쏠린 발도 김 씨가 진단하고 신발을 처방한다.
어떤 손님은 발이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신을 수 있는 구두가 없었다.
“그 손님도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어야하는데 발 모양이 너무 특이하니까 다른 곳에선 안 받아줬어요. 두 번에 걸쳐서 구두를 만들었죠. 한 방에 발이 안 맞아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 손님은 정장에 맞는 구두를 신을 줄 몰랐다며 연거푸 감사인사 했다.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수제화협회 회장을 맡았다.
처음 회장직을 맡고 “신발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향촌동 수제화 골목은 옛날 명성이 많이 기울었다.
2002년 이후로 값싼 중국산 합성피혁이 들어오고 기성화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수제화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값싼 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결국 악수였다.
값싼 가죽은 구두의 품질을 낮출 뿐 아니라 수제화의 브랜드 가치도 떨어트렸다.
김 씨는 우선 수제화의 떨어진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이 없는 자기성찰, “사람이 기술을 따라 잡아야 해”
김씨는 다른 사람이 구두를 만들 때 잘 만들고 있는지 주시하는 버릇이 있다.
“수제화는 공정 단계가 많아서 한 곳에서 실수하면 신발이 잘못 나와요.”
김 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괜히 핀잔주는 줄 알고 툴툴댔다.
핀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
2019년 대구광역시수제화협회에서 주관한 대구수제화아카데미 학생들이다.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소 버릇이 나와 버렸다.
아차! 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좋아했다.
“아하! 그래서 모양이 안 잡혔구나.”
학생들이 핀잔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책으로 못 배우는 가피며 미싱 같은 기술을 모조리 전수해줬다.
다음 세대에 대한 김 씨의 관심과 걱정은 각별하다.
“대구수제화아카데미로 기술 전수 시스템은 잘 마련됐지만 청년들의 창업 준비를 위한 기계나 사무실 지원이 부족해 다소 아쉽습니다.” 의견을 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수제화아카데미와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열어 수제화의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대구광역시수제화협회 회장 자리는 이제 물러났지만 기술고문으로서 협회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향촌동 수제화 골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0-12-01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