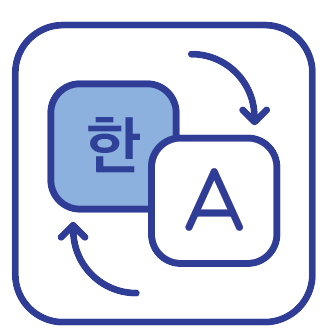신발 人
| 제목 | 동길산 시인의 신발 이바구㉒ 신발의 시 | ||
| 작성일 | 2022-10-15 | 조회수 | 430 |
동길산 시인의 신발 이바구㉒ 신발의 시
2022-10-15 430
신발이바구㉒신발의 시
시대와 시대를 잇는 예술혼 ‘신발’
신발과 시는 밀접하다. 신발도 일상이고 시도 일상인 까닭이다. 시에서 신발은 떠남이나 여행으로, 때로는 방랑의 아이콘으로 등장한다. 구체적으론 어떤 시가 있을까. 한자 일색인 고시조에서 상가에 널브러진 구두를 보며 공동체를 노래한 최근의 시까지 ‘신발의 시’ 몇 편을 들여다보자.
홍진을 다 떨치고 죽장망혜 짚고 신고
거문고 들어 메고 서호로 돌아가니
노화에 떼 많은 갈매기는 제 벗인가 하노라.
이 고시조의 작자는 김성기(金聖器). 조선 숙종과 예종 때 이름을 날렸으니 400년 전 사람이다. 한량이었다. 궁인(弓人)으로 발탁될 만큼 활을 잘 쏘았지만 활을 버리고 거문고를 택해 거문고 명인으로 불렸다. 호를 조은(釣隱) 또는 어은(漁隱)이라 할 정도로 낚시를 즐겼다. 한마디로 세상사에 무심했다.
이 시는 김성기의 ‘세상사 무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거문고 둘러메고 멀리 떠나서 노화(蘆花, 갈대) 우거진 호수에서 낚시하겠다는 이야기다. 현대 직장인의 로망을 400년 전 김성기도 품었다. 이런 것을 보면 400년 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인 모양이다.
‘조선의 방랑시인’ 김 삿갓의 표준영정. 삿갓과 대나무 지팡이, 망혜 신발의 전형이다. 김 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이다.
멀리 떠나려면 여행 채비를 갖춰야 했다. 옷도 거기에 맞춰서 입어야 하고 신발 역시 그래야 했다. 김성기는 어떤 채비를 갖췄을까. 시에 나온다. 첫 연에 나오는 죽장망혜(竹杖芒鞋)가 김성기의 여행 채비였다.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 망혜는 짚신 비슷한 신발이었다. 먼 길을 떠나는 채비의 상징이 조선시대는 대나무 지팡이와 망혜라는 신발이었다. 죽장망혜는 ‘조선의 방랑시인’ 김 삿갓의 대표 복장이기도 했다.
망혜는 짚신과 비슷했다. 삼이나 모시 껍질로 삼았다. 정식 명칭은 마혜(麻鞋). 우리말로는 미투리라고 했다. 일반 짚신보다는 촘촘해서 질겼고 고왔다. 미투리는 조선을 대표하는 신이었다. 서민층의 남녀가 신었으며 수공이 두 배 이상 들어간 섬세한 미투리는 사대부에서 신었다. 조선의 신발은 신분에 따라서 가죽 같은 재료의 차이뿐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차이를 뒀음을 알 수 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낯선 친구 만나면/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천안 삼거리를 지나도/쑤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가는 길……//신을 벗으면/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 한하운 시 ‘전라도 길’
1940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한하운(1920년∼1975년)은 생이 고단했다. 세계의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보다 훨씬 앞서는 중국 베이징대학을 대학원까지 졸업한 부유한 집안의 수재였고 촉망받는 공무원이었지만 스물다섯 나이에 ‘천형(天刑)의 숙환’ 나병이 악화하면서 나락으로 접어들었다. 1946년 함흥학생사건에 연루되어 반동분자로 투옥되었으며 1948년 공산 치하를 피해 월남하여 한동안 방랑하며 유랑했다.
‘소록도 가는 길’이란 부제가 붙은 이 시는 방랑과 유랑의 소산이었다. 나환자가 거주하는 소록도로 절름거리며 가는 한여름, 잠시 쉬면서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는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아픔을 시에 담았다. 시 어디에서 아프다는 말이 없고 앓는 소리가 없지만 읽어본 이 누구라도 아픔을 느끼고 비애를 느낀다. 이 시가 명시로 꼽히는 이유다.
한하운이 신은 신발은 지까다비(じかたび). 일본어다. 노동자가 신는 작업화를 말한다. 튼튼한 천과 두꺼운 고무로 만들어 대단히 질기다. 일본인의 신발 지까다비는 1940년대를 대표하는 패션이었다. 왜정 말기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이른바 ‘앗빠빠’라고 불리던 간단한 양장과 몸빼 바지가 국민복으로 강요되던 때였다.
왜(倭)바지, 또는 일 바지로 불리는 몸빼는 1940년대 왜정 말기 판을 쳤다. 해방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할머니 세대가 즐겨 입는 바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근로보국대에 끌려간 조선의 여성은 일본 여성의 작업복 몸빼 바지에다 편리한 저고리나 실용적인 남방을 걸쳤다.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창고에서 쏟아져 나왔던 지까다비는 1948년 정부 수립이 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몸빼는 세대를 이었다. 몸빼 유래를 몰랐던 탓이 컸다.
저녁 상가에 구두들이 모인다
아무리 단정히 벗어놓아도
문상을 하고 나면 흐트러져 있는 신발들,
젠장 구두가 구두를
짓밟는 게 삶이다
밟히지 않는 건 망자의 신발뿐이다
정리가 되지 않는 상가의 구두들이여
저건 네 구두고
저건 네 슬리퍼야
돼지고기 삶는 마당가에
어울리지 않는 화환 몇 개 세워 놓고
봉투 받아라 봉투,
화투짝처럼 배를 뒤집는 구두들
밤 깊어 헐렁한 구두 하나 아무렇게나 꿰신고
담장가에 가서 오줌을 누면, 보인다
북천에 새로 생긴 신발자리 별 몇 개
- 유흥준 시 ‘상가에 모인 구두들’
올해 갑년을 맞은 유흥준의 이 시는 다의적이다. 누구는 삶의 통찰을 읽고 누구는 풍자를 읽는다. 통찰이든 풍자든 이 시가 이르는 귀결은 ‘신발자리 별 몇 개’ 같은 희망이다. ‘밤 깊어 헐렁한 구두 하나 아무렇게나 꿰신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랄지 소망을 이 시는 노래한다.
코로나가 슬슬 물러갈 조짐이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를 핑계로 문상하는 대신 계좌 입금이 이 시대 신풍속도로 자리잡았다. 약간은 취기가 오른 채 흐트러진 신발 사이에서 내 신발을 찾던 때가 언제였나 싶다. 망자를 보내는 아픔은 신발과 신발이 뒤섞이고 겹치면서 비로소 견딜 수 있었는데도 그랬다. 상가에 다시 구두가 모일 날이 슬슬 다가온다.